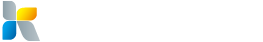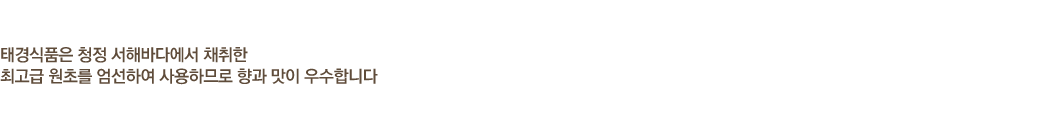시알리스 효능 ╈ 시알리스 구입약국 ╈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환우이빛 작성일25-12-10 20:50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
 http://59.cia158.net
0회 연결
http://59.cia158.net
0회 연결
-
 http://91.cia367.net
0회 연결
http://91.cia367.net
0회 연결
본문
시알리스20mg ╈ 인터넷 레비트라 판매 ╈
바로가기 go !! 바로가기 go !!
━
[조성익의 인생 공간] 빈 국립 오페라 극장
빈 국립 오페라 극장 로지석. 청년 등에게 최고의 자리에서 오페라를 관람할 기회를 주기 위해 3만원 짜리 입석표도 판매한다. [사진 조성익]
푸 오리지널바다이야기 치니의 ‘투란도트’가 연주되고 있는 오페라 극장. 어둠 속 첩보원이 청중석에 앉은 총리에게 총을 겨누고 있다. 테너의 아리아가 가장 높은 음에 이르면 방아쇠를 당기려는 긴장된 순간이다. 영화 ‘미션 임파서블’의 한 장면, 그 배경인 이곳은 오스트리아 ‘빈 국립 오페라 극장’이다. 이 극장의 독특한 점은 총리가 앉아 있던 로지(loge)석이다. 상층부에 발코 바다이야기꽁머니 니처럼 튀어나온 좌석인데 벽으로 분리된 작은 방이라 총리 같은 주요 인사가 앉기에 적합하다. 오스트리아를 여행하던 중 이 로지석을 예약해서 공연을 관람했다. 이 순간을 위해 트렁크에 넣어 간 좋은 재킷도 입었다.
로지석에 앉자 극장이 한눈에 들어왔다. 공연을 벌이는 무대만 한눈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아래에 앉아있는 관 릴게임신천지 객들의 얼굴도 한눈에 볼 수 있었다. 멋을 잔뜩 부리고 데이트 온 노부부, 대놓고 졸고 있는 아저씨. 과거에는 귀족들이 이 높은 곳에 앉아 평민들을 내려다봤으리라. 다만 한 가지, 로지석은 의외로 좁았다. 난간에는 필자를 포함해 세 사람이 앉았는데, 좌우로 나이 지긋한 두 분이 딱 붙어 앉아 있어서 옴짝달싹 할 수 없었다.
빈 국립 오페 릴게임하는법 라 극장 ‘입석 문화’ 유명 뒤에 두 사람이 더 앉아 있었는데 공연 시작 전 잠시 이야기를 나눠보니 오페라 관람이 처음인 신혼 부부였다. 총 5명의 관객이 들어찬 로지석. 그런데 공연이 시작되기 직전 또 한 명이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청바지에 운동화를 신은 청년이었는데 황당하게도 이 청년은 좌석 없이 서서 공연을 관람했다. 처음에는 몰래 들어 온 얌체족 백경게임 인줄 알았다. 그런데 쉬는 시간에 물어보니 당당히 입석표를 사서 들어왔다는 것이다. 아니, 이 유서 깊은 빈 국립 오페라 극장에, 그것도 고급스런 로지석에 입석 자리가 웬 말인가. 더 놀라운 것은 티켓 가격이었다. 필자가 앉았던 앞자리는 대략 40만원 정도, 이 청년의 입석표는 단돈 3만원! 같은 로지석인데 무려 15배 차이가 났다.
[일러스트 조성익]
왜 입석표를 두었을까? 푼돈이라도 벌어보려는 꼼수는 아닐텐데. 실제로 빈 국립 오페라 극장은 ‘입석 문화’로 유명하다. 청년층이나 가난한 예술가들에게 최고의 자리에서 오페라를 관람할 기회를 주려는 철학 때문이다. 그 덕에 오스트리아 사람들은 고등학생 때부터 입석으로 오페라를 보고 자란다고 한다. 총 1700석 중 무려 400석이 입석이라, 티켓을 구할 가능성도 꽤 높은 편이다. 다만, 당일 티켓을 구하러 줄을 서는 수고는 해야 한다.
오페라는 누구나 쉽게 즐기는 예술은 아니다. 자칫 특정 계층만의 고급 문화로 굳어지기 쉽다. 하지만 빈 국립 오페라 극장은 이런 문화적 계층화 속에 틈새를 만들어두었다. 입석에서 오페라를 보던 고등학생은 나이가 들어서도 오페라 팬으로 남을 것이다. 로지석에 들어가 본 경험은 가난한 예술가를 세계적인 오페라 가수로 만들 수 있다. 위계는 인정하되, 기회는 부여한다. 입석 티켓에 담긴 철학이다.
160년 전, 빈 국립 오페라 극장이 세워진 1860년대는 오스트리아가 현대 도시 모습을 갖춰가던 시기였다. 당시 황제 프란츠 요제프 1세는 오래된 중세 성벽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거대한 원형 대로인 ‘링슈트라세(Ringstraße)’를 건설했다. 군사 방어 기능을 없애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산책길을 만드는 정책이었다.
그 링슈트라세에 지어진 첫 건물이 바로 빈 국립 오페라극장이다. 누구나 걸어서 갈 수 있는 위치는 문화가 특정 계층의 사치품이 아니라 도시 시민들의 공유 자산이라는 선언이었다. 즉, 오페라 극장은 지어진 순간부터 이미 문화의 공공성, 도시의 민주화를 상징하는 건축물이었다.
우리는 같은 도시에 살지만 서로 다른 공간에 산다. 도시의 공간에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청담동과 신촌의 커피 값은 다르다. 이 가격 차이로 공간을 찾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나뉜다. 분양 아파트와 임대 아파트 사이에는 담장이 쳐지고, 청년 주택과 시니어 주택으로 세대별 공간이 나뉜다. 외국인 노동자가 사는 동네는 따로 있으며 한국인은 잘 가지 않는다. 빈부·세대·성별·인종 별로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 도시에 그어져 있다. 물론 이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공간은 공정하지 않다. 회의실 의자 하나에도 사장 자리와 사원 자리가 있다. 공간에는 위계가 숨어 있고, 그 위계로 사람을 가른다.
그럼에도 이런 공간들을 오갈 수 있는 작은 틈새 하나쯤은 존재해야 한다. 노인, 여행객, 신혼부부, 대학생이 한 공간에 모여 앉아 같은 경험을 나누는 것. 이는 그 어떤 사회 통합 정책보다 강력하기 때문이다. 로지석에서는 세대 간 미움이나 소득 차이로 인한 불평등의 감정이 사라진다. 대신 음악을 사랑한다는 공통점이 서로의 마음에 각인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이어주는 사회 연결 공간이다.
오페라 중간 휴식 시간에 로비로 나왔다. 로비는 우아하고 아름다운 장식으로 가득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커피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기엔 비좁았다. 하지만 그 덕분에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극장 앞 광장으로 흘러나갔다. 링슈트라세를 지나가는 행인들과 오페라 관람객이 뒤섞여 밤의 장관을 이뤘다. 이 건물은 오페라 공연장이라는 경계선마저 넘어서는 사회 연결 공간이었다.
오페라가 끝난 후에도 주변에서 감동의 여운을 이어갈 수 있다. 달콤한 마무리를 원한다면 그 유명한 카페 자허(Cafe Sacher)로, 짭짤한 마무리를 원한다면 소시지 가판대로 가보라. 우연히 함께 자리한 오페라 팬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공연보다 중요한 것은 여운을 함께 나눌 사람들과의 연결이다. 박수 소리가 끝나기도 전에 주차장으로 재빨리 달려가 차를 빼야 하는 우리나라 공연 경험과는 큰 차이가 있었다.
종로 ‘엘지포차’ 야구팬 이어주는 공간
종로 ‘엘지포차’ 풍경. 야구를 사랑하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이다. [사진 조성익]
우리 도시에는 서로 만날 일 없는 계층이 한 공간에 모이는 사회 연결 공간이 있을까? 종로의 ‘엘지포차’는 프로야구 엘지 트윈스를 응원하는 팬들이 모이는 맥주집이다. 야구 경기가 열리는 날이면 예약을 해야 할 정도로 붐빈다. 트윈스가 연승을 달리고 있던 어느 저녁, 엘지포차 야외 테이블에 앉아 TV로 경기를 봤다. 제주도에서 올라온 두 청년과 합석했는데, 응원 단장 역할을 하던 사장님이 오시더니 손님들 사이에 대화를 터주었다. 서로 주문한 안주를 나눠 먹고, 안타가 나올 때마다 하이파이브를 했다. 메뉴판 첫 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이곳은 흔한 술집이 아닙니다. 야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같은 순간, 응원하고 위로 받는 작은 야구장이죠. 사랑스러운 어린이 팬들도 많이 옵니다. 욕설 자제, 술은 주량만큼만.’
공간은 우리를 하나로 묶어준다. 공동의 경험을 나누며 우리가 서로 이어진 인간이고 연대를 통해 위로 받을 수 있는 존재임을 깨닫게 한다. 우리는 각자의 형편에 맞게 집을 구하고, 각자의 능력에 맞게 사무실 책상 하나를 차지하며 살아간다. 주거와 업무 공간은 그래서 어쩌면 지금의 나를 증명하는 공간이다. 하지만 문화시설은 지금의 우리 모습을 증명하는 공간이다. 현충일이면 야구장은 가장 좋은 좌석을 군인에게 내주고, 경기 시작 전 그들에게 감사의 박수를 보내게 한다. 우리가 언제 지나가던 군인에게 진심 어린 박수를 쳐본 적이 있던가. 때론 소외 계층 어린이를 초대해 사회 속에서 함께 어울리며 응원하는 경험을 준다. 그들이 당장의 현실을 딛고 일어나 야구 선수의 꿈을 꾸도록 도와준다.
문화시설은 사회 통합의 장치다. 이것을 알고 있던 프란츠 요제프 1세는 도시를 바꾸고 오페라 극장을 지었던 것이다. 박물관에 관객이 넘치고, 음악당과 미술관이 신축되고… 우리 도시는 실로 문화의 부흥기에 있다. 하지만 한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다. 문화 시설은 단순히 문화를 소비하고 국격을 높이는 것을 넘어서야 한다. 빈 국립 오페라 극장의 로지석처럼 사회 구성원을 하나로 모아 공동의 추억을 만들어주는 공간. 문화시설이란 결국, 나와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사람을 한 공간에 앉혀 같은 순간을 바라보게 하는 장소다.
조성익 건축가. 홍익대 교수이자 TRU 건축사무소의 대표 건축가다. 맹그로브 숭인 코리빙으로 한국 건축문화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공간과 삶, 그리고 사람에 대한 애정으로 책 『건축가의 공간 일기』를 출판했다. 기자 admin@119sh.info
[조성익의 인생 공간] 빈 국립 오페라 극장
빈 국립 오페라 극장 로지석. 청년 등에게 최고의 자리에서 오페라를 관람할 기회를 주기 위해 3만원 짜리 입석표도 판매한다. [사진 조성익]
푸 오리지널바다이야기 치니의 ‘투란도트’가 연주되고 있는 오페라 극장. 어둠 속 첩보원이 청중석에 앉은 총리에게 총을 겨누고 있다. 테너의 아리아가 가장 높은 음에 이르면 방아쇠를 당기려는 긴장된 순간이다. 영화 ‘미션 임파서블’의 한 장면, 그 배경인 이곳은 오스트리아 ‘빈 국립 오페라 극장’이다. 이 극장의 독특한 점은 총리가 앉아 있던 로지(loge)석이다. 상층부에 발코 바다이야기꽁머니 니처럼 튀어나온 좌석인데 벽으로 분리된 작은 방이라 총리 같은 주요 인사가 앉기에 적합하다. 오스트리아를 여행하던 중 이 로지석을 예약해서 공연을 관람했다. 이 순간을 위해 트렁크에 넣어 간 좋은 재킷도 입었다.
로지석에 앉자 극장이 한눈에 들어왔다. 공연을 벌이는 무대만 한눈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아래에 앉아있는 관 릴게임신천지 객들의 얼굴도 한눈에 볼 수 있었다. 멋을 잔뜩 부리고 데이트 온 노부부, 대놓고 졸고 있는 아저씨. 과거에는 귀족들이 이 높은 곳에 앉아 평민들을 내려다봤으리라. 다만 한 가지, 로지석은 의외로 좁았다. 난간에는 필자를 포함해 세 사람이 앉았는데, 좌우로 나이 지긋한 두 분이 딱 붙어 앉아 있어서 옴짝달싹 할 수 없었다.
빈 국립 오페 릴게임하는법 라 극장 ‘입석 문화’ 유명 뒤에 두 사람이 더 앉아 있었는데 공연 시작 전 잠시 이야기를 나눠보니 오페라 관람이 처음인 신혼 부부였다. 총 5명의 관객이 들어찬 로지석. 그런데 공연이 시작되기 직전 또 한 명이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청바지에 운동화를 신은 청년이었는데 황당하게도 이 청년은 좌석 없이 서서 공연을 관람했다. 처음에는 몰래 들어 온 얌체족 백경게임 인줄 알았다. 그런데 쉬는 시간에 물어보니 당당히 입석표를 사서 들어왔다는 것이다. 아니, 이 유서 깊은 빈 국립 오페라 극장에, 그것도 고급스런 로지석에 입석 자리가 웬 말인가. 더 놀라운 것은 티켓 가격이었다. 필자가 앉았던 앞자리는 대략 40만원 정도, 이 청년의 입석표는 단돈 3만원! 같은 로지석인데 무려 15배 차이가 났다.
[일러스트 조성익]
왜 입석표를 두었을까? 푼돈이라도 벌어보려는 꼼수는 아닐텐데. 실제로 빈 국립 오페라 극장은 ‘입석 문화’로 유명하다. 청년층이나 가난한 예술가들에게 최고의 자리에서 오페라를 관람할 기회를 주려는 철학 때문이다. 그 덕에 오스트리아 사람들은 고등학생 때부터 입석으로 오페라를 보고 자란다고 한다. 총 1700석 중 무려 400석이 입석이라, 티켓을 구할 가능성도 꽤 높은 편이다. 다만, 당일 티켓을 구하러 줄을 서는 수고는 해야 한다.
오페라는 누구나 쉽게 즐기는 예술은 아니다. 자칫 특정 계층만의 고급 문화로 굳어지기 쉽다. 하지만 빈 국립 오페라 극장은 이런 문화적 계층화 속에 틈새를 만들어두었다. 입석에서 오페라를 보던 고등학생은 나이가 들어서도 오페라 팬으로 남을 것이다. 로지석에 들어가 본 경험은 가난한 예술가를 세계적인 오페라 가수로 만들 수 있다. 위계는 인정하되, 기회는 부여한다. 입석 티켓에 담긴 철학이다.
160년 전, 빈 국립 오페라 극장이 세워진 1860년대는 오스트리아가 현대 도시 모습을 갖춰가던 시기였다. 당시 황제 프란츠 요제프 1세는 오래된 중세 성벽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거대한 원형 대로인 ‘링슈트라세(Ringstraße)’를 건설했다. 군사 방어 기능을 없애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산책길을 만드는 정책이었다.
그 링슈트라세에 지어진 첫 건물이 바로 빈 국립 오페라극장이다. 누구나 걸어서 갈 수 있는 위치는 문화가 특정 계층의 사치품이 아니라 도시 시민들의 공유 자산이라는 선언이었다. 즉, 오페라 극장은 지어진 순간부터 이미 문화의 공공성, 도시의 민주화를 상징하는 건축물이었다.
우리는 같은 도시에 살지만 서로 다른 공간에 산다. 도시의 공간에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청담동과 신촌의 커피 값은 다르다. 이 가격 차이로 공간을 찾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나뉜다. 분양 아파트와 임대 아파트 사이에는 담장이 쳐지고, 청년 주택과 시니어 주택으로 세대별 공간이 나뉜다. 외국인 노동자가 사는 동네는 따로 있으며 한국인은 잘 가지 않는다. 빈부·세대·성별·인종 별로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 도시에 그어져 있다. 물론 이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공간은 공정하지 않다. 회의실 의자 하나에도 사장 자리와 사원 자리가 있다. 공간에는 위계가 숨어 있고, 그 위계로 사람을 가른다.
그럼에도 이런 공간들을 오갈 수 있는 작은 틈새 하나쯤은 존재해야 한다. 노인, 여행객, 신혼부부, 대학생이 한 공간에 모여 앉아 같은 경험을 나누는 것. 이는 그 어떤 사회 통합 정책보다 강력하기 때문이다. 로지석에서는 세대 간 미움이나 소득 차이로 인한 불평등의 감정이 사라진다. 대신 음악을 사랑한다는 공통점이 서로의 마음에 각인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이어주는 사회 연결 공간이다.
오페라 중간 휴식 시간에 로비로 나왔다. 로비는 우아하고 아름다운 장식으로 가득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커피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기엔 비좁았다. 하지만 그 덕분에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극장 앞 광장으로 흘러나갔다. 링슈트라세를 지나가는 행인들과 오페라 관람객이 뒤섞여 밤의 장관을 이뤘다. 이 건물은 오페라 공연장이라는 경계선마저 넘어서는 사회 연결 공간이었다.
오페라가 끝난 후에도 주변에서 감동의 여운을 이어갈 수 있다. 달콤한 마무리를 원한다면 그 유명한 카페 자허(Cafe Sacher)로, 짭짤한 마무리를 원한다면 소시지 가판대로 가보라. 우연히 함께 자리한 오페라 팬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공연보다 중요한 것은 여운을 함께 나눌 사람들과의 연결이다. 박수 소리가 끝나기도 전에 주차장으로 재빨리 달려가 차를 빼야 하는 우리나라 공연 경험과는 큰 차이가 있었다.
종로 ‘엘지포차’ 야구팬 이어주는 공간
종로 ‘엘지포차’ 풍경. 야구를 사랑하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이다. [사진 조성익]
우리 도시에는 서로 만날 일 없는 계층이 한 공간에 모이는 사회 연결 공간이 있을까? 종로의 ‘엘지포차’는 프로야구 엘지 트윈스를 응원하는 팬들이 모이는 맥주집이다. 야구 경기가 열리는 날이면 예약을 해야 할 정도로 붐빈다. 트윈스가 연승을 달리고 있던 어느 저녁, 엘지포차 야외 테이블에 앉아 TV로 경기를 봤다. 제주도에서 올라온 두 청년과 합석했는데, 응원 단장 역할을 하던 사장님이 오시더니 손님들 사이에 대화를 터주었다. 서로 주문한 안주를 나눠 먹고, 안타가 나올 때마다 하이파이브를 했다. 메뉴판 첫 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이곳은 흔한 술집이 아닙니다. 야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같은 순간, 응원하고 위로 받는 작은 야구장이죠. 사랑스러운 어린이 팬들도 많이 옵니다. 욕설 자제, 술은 주량만큼만.’
공간은 우리를 하나로 묶어준다. 공동의 경험을 나누며 우리가 서로 이어진 인간이고 연대를 통해 위로 받을 수 있는 존재임을 깨닫게 한다. 우리는 각자의 형편에 맞게 집을 구하고, 각자의 능력에 맞게 사무실 책상 하나를 차지하며 살아간다. 주거와 업무 공간은 그래서 어쩌면 지금의 나를 증명하는 공간이다. 하지만 문화시설은 지금의 우리 모습을 증명하는 공간이다. 현충일이면 야구장은 가장 좋은 좌석을 군인에게 내주고, 경기 시작 전 그들에게 감사의 박수를 보내게 한다. 우리가 언제 지나가던 군인에게 진심 어린 박수를 쳐본 적이 있던가. 때론 소외 계층 어린이를 초대해 사회 속에서 함께 어울리며 응원하는 경험을 준다. 그들이 당장의 현실을 딛고 일어나 야구 선수의 꿈을 꾸도록 도와준다.
문화시설은 사회 통합의 장치다. 이것을 알고 있던 프란츠 요제프 1세는 도시를 바꾸고 오페라 극장을 지었던 것이다. 박물관에 관객이 넘치고, 음악당과 미술관이 신축되고… 우리 도시는 실로 문화의 부흥기에 있다. 하지만 한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다. 문화 시설은 단순히 문화를 소비하고 국격을 높이는 것을 넘어서야 한다. 빈 국립 오페라 극장의 로지석처럼 사회 구성원을 하나로 모아 공동의 추억을 만들어주는 공간. 문화시설이란 결국, 나와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사람을 한 공간에 앉혀 같은 순간을 바라보게 하는 장소다.
조성익 건축가. 홍익대 교수이자 TRU 건축사무소의 대표 건축가다. 맹그로브 숭인 코리빙으로 한국 건축문화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공간과 삶, 그리고 사람에 대한 애정으로 책 『건축가의 공간 일기』를 출판했다. 기자 admin@119sh.info